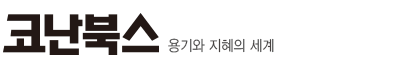<한국일보>에 ‘우리 출판사 첫 책’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얼마 전 여기에 실을 원고를 써달라는 청탁이 왔고 써서 보냈는데, 오늘 기자가 전화를 해서 올해를 끝으로 이 코너가 폐지되었다고 하네요. 으르렁.
덕분에 첫 책 만들던 때를, 이 책을 들고 처음으로 서점엘 가던 때를 오랜만에 떠올렸습니다. 책을 내고 어쩔 줄 몰라 아무것도 안 했는데 책이 나가다니, 신기해하던 때기도 했습니다. 이 글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도모하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
2013년 봄께 출판사를 퇴사했고, 다른 곳에 재취업을 할지 출판사를 꾸릴지 갈팡질팡하던 마음이 창업 쪽으로 고꾸라졌다. 출판 경력 5년. 자본금 없음. 원고 없음. 그런 상태로 출발했다. 기왕 자영업의 길에 들어섰으니 속도를 내야 했다.
(회사 이름도 정하지 못한 채로) 그동안 책을 만들었던 저자들을 만나 새 책을 제안했다. 다행히 책을 쓰기로 했고 더 다행스럽게도 마감을 어긴 적이 없는 저자들이었다. 불행하게도 나는 조급했다. 원고가 들어오기만을 기다릴 수 없었다. 책을 만들어 팔기 전까지는 통장에 지출만 찍힐 것이었기 때문이다.
‘공저라면 더 빨리 원고가 나오지 않을까. 원고가 있는 경우라면 그보다도 빨리 책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럴 만한 아이템을 궁리하다가 온케이웨더라는 기상전문매체를 떠올렸다. 기상전문매체답게 날씨와 경영, 기후변화 문제, 관련 전문가 인터뷰까지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하는 곳이었다.
기획은 꽤 묵은 아이템이었다. ‘굿바이 사계절’이라는 가제였다. 몇 년 전 어느 시사주간지에서 ‘한반도의 아열대화’ 기사를 읽었는데 기후변화가 경제, 건강, 일상에 직격탄을 퍼붓고 있다는 기사였다. 기후변화 문제를 일상으로 끌어올 수 있겠다 싶어 회사에 다니는 동안에도 여러 저자를 접촉했다가 엎어진 터였다.
그동안 온케이웨더 기자들이 작성한 기사를 주제별로 묶었다. 기후변화의 원인이야 초등학생부터 배우는 것이니 우면산 산사태, 제습기 판매 급증, 전력 블랙아웃의 이면에 숨은 기후변화의 영향을 드러내고 싶었다. 그리고 전문가 인터뷰를 추가해 덧붙여달라고 요구했다. 기상 전문가뿐 아니라 의류회사, 보험회사, 보건 전문가 등에게 이상기후에 각 분야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물어 글로 풀었다.
이 책에 가장 많이 등장한 구절을 꼽자면 ‘기상 관측 이래’가 아닐까 싶다. 그만큼 최고/최저기온, 최장 장마/폭염, 최대 강수/강설량 등이 2000년대에 신기록을 세웠다. 그런 기록들을 시각적으로 보이고자 광고 사진작가를 섭외해 스튜디오에서 직접 촬영하고 그 위에 그래픽을 얹는, 일종의 ‘실사 인포그래픽’을 시도했다(표지도 그런 콘셉트로 인물 촬영을 했으나 구현하기가 쉽지 않아 포기해야 했다.)
메일함을 뒤져보니 저자들에게 제안 메일을 쓰고 6개월 만에 책이 나왔다. 각각의 기사를 하나의 흐름으로 조합했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해체해 재조합하는 과정을 반복하느라(이 과정은 편집자인 내 몫이었다) 생각만큼 빠르게 출간하진 못했다.
그러나 천둥벌거숭이 자영업자에게 조금의 용기를 건넨 책이었다. ‘한국사회’ ‘논픽션’을 출간 방향으로 잡은 코난북스의 (나만 아는) 시그니처이기도 하다. 그래서 가장 아끼는 책이 뭐냐 물을 때 이 책을 꼽는 일은 없지만 적수공권 시절을 견디게 해준 가장 고마운 책이 이 책이다.